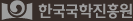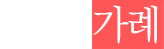제례란
제례도구
소품
신주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 패, 신주신주(神主)란 돌아가신 조상(祖上)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여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은 나무로 만든 패(牌)이다. 위패(位牌)ㆍ목주(木主)ㆍ영위(靈位)ㆍ위판(位版) 등으로도 불린다. 신주를 만드는 나무의 종류는 밤나무인데 만약 밤나무가 없으면 견고한 나무로 만든다.신주는 정이천(程伊川)의 목주 제도를 따른 것인데, 위를 깎는 것이나 구멍을 파는 곳에는 모두 음양의 수가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우제(虞祭) 때에 뽕나무를 사용한 우주(虞主)를 만들었고, 1년 뒤에 소상(小祥)인 연제(練祭)를 지내고 난 뒤에 밤나무로 바꾸었다. 요즘 바로 밤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간편함 때문이라고 한다. 뽕나무를 사용한 것은 그 이름과 그 거친 것을 따른 것인데, 효자의 마음에 적절하게 한 것이다.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 것은 공경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곡량전(穀梁傳)』에 의하면 오른쪽 신주는 8치이고, 왼쪽 신주는 7치라고 하여 신주의 크기를 달리하기도 한다. 이 때 오른쪽 신주는 아버지의 신주로서 고위(考位)이고 왼쪽 신주는 어머니의 신주로서 비위(妣位)이다. 그러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신주 형식에는 크기 차이가 없다.
유일한 하나인 신주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위패신주 따위를 통칭하는 말로 위패가 있다. 그래서 신주와 위패는 곧잘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개념은 다르다. 신주는 돌아가신 조상신의 상징으로 유일한 하나인 반면 위패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패로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즉, 서원이나 향교에 모실 때 신주는 그 집안에 그대로 있고, 이를 대신하는 위패를 모시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신주의 구조신주의 구조는 받침과 주신(主身), 분면(粉面)으로 구성된다. 받침은 부(趺)라고 하는데, 사방 4치이다. 이는 한 해의 4계절을 본뜬 것이다. 받침의 두께는 1치 2푼인데, 이는 하루의 12시간을 본뜬 것이다. 받침은 바닥을 관통하도록 파내어 신주의 몸체를 꽂을 수 있도록 한다. 신주의 몸체는 주신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1자 2치로 1년 12달을 본떴다. 주신의 너비는 3치로 이는 30푼이어서 1달의 날 수를 본뜬 것이다. 주신의 두께 역시 1치 2푼으로 하루 12시간을 본뜬 것이다. 주신의 위쪽을 5푼 깎아내어 머리를 둥글게 한다. 1치를 내려와 앞면을 깎아 턱을 만들고 4푼은 앞쪽에, 8푼은 뒤쪽으로 가게 주신을 쪼갠다.턱 아래는 한 가운데에 홈을 파내는데, 이곳을 함중(陷中)이라고 한다. 이곳에 고인(故人)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를 ‘고모관모공휘모자모신주(故某官某公諱某字某神主)’라고 쓴다. 그 옆쪽에 구멍을 뚫어 가운데로 통하게 하는데, 이를 규(竅)라 한다. 구멍의 지름은 4푼이고, 턱에서 3치 6푼 아래에 있다. 그 앞쪽에 분면이 있다. 글씨를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흰색 분을 발라 분면이라고 한다. 분면에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라고 쓰고 그 옆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이름을 ‘효자모봉사(孝子某奉祀)’라고 쓰는데, 이를 방제(旁題)라고 한다. 신주의 분면은 대가 바뀌면 고쳐 쓸 수가 있지만 함중은 고쳐 쓰지 않는다.
신주에 쓰는 관직에 있어서 임직과 증직의 순서 논란신주에 관직을 쓸 때 실제 직위인 임직(任職)을 먼저 쓸 것인가 증직(贈職)을 먼저 쓸 것인가 논란이 있다. 옛날에는 모두 임직을 먼저 쓰고 나서 증직을 썼다. 이에 대해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증직을 먼저 쓰는 것은 나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뜻이 있다. 그러나 관직의 높고 낮음과 일의 선후가 모두 도치되었다. 변경하여 옛 것을 따르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즉, 증직을 먼저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주자대전(朱子大典)』에 근거하여 먼저 실직을 쓰고 뒤에 증직을 쓰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즉, 신주 등에는 반드시 실직을 먼저 쓰고 증직을 쓰는 것이 규정이지만, 나라에서 증직을 내린 것을 더 생각한다면 증직을 먼저 쓴다는 것이다.
평상시와 비상시 신주를 모시는 방법신주는 독(櫝)에 넣어 모시는데, 바닥에는 자(藉)라고 하여 요를 깔고 그 위에 놓으며 도(韜)라고 하여 주머니를 만들어 덮어씌운다. 그리고 이 독을 사당(祠堂)의 감실(龕室)에 모신다.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시는 일을 평상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예를 행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쟁 등으로 인해 부득이 집을 비울 때 신주의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보유편(補遺編)」을 두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신(神)의 도(道)는 고요함을 중시한다. 떠도는 중에 봉안할 수 없어 무덤에 묻어두면 오랜 뒤에 썩어 없어지고, 나뭇결과 글자 획이 흐려진다. 한 상자에 봉안하여 짊어지거나 수레에 싣고 몸으로 보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물며 3년 이내의 궤연(几筵)은 결코 묻어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신의 도가 고요함을 중시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어두운 사람의 말이다. 우리 집에서는 임진왜란 때 주독을 버리고 신주만 상자에 넣어 짐바리 위에 봉안하여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궤연에는 조석(朝夕)으로 상식을 해야 하니 더욱 묻어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다른 주장을 펴는데, ‘길에서 욕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기보다는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여 함께 피난하는 것을 반대한다.성호 이익(星湖 李瀷)은 “필부가 전쟁으로 인해 돌아다닐 때 4대의 8개 신주를 어찌 받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비단을 접어 신(神)이 의지하는 제도, 예를 들어 세속에서 쓰는 혼백과 같이 만들어 전을 올리고 갈 것이다. 나무 신주는 묻었다가 만일 죽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다시 봉안하되, 혼은 부서지거나 썩었으면 다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난 시 신주 처리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의 신주가 없어져 요즘은 유명 종가(宗家)를 제외하고 신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