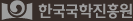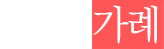관례란
관례도구
복식
복두
삼가에서 관자에게 씌우는 관인 복두복두(幞頭)는 삼가(三加)에서 관자(冠者)에게 씌우는 관이다. 복두란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이다. 사모(紗帽)처럼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쪽 좌우에 각(脚, 복두의 뒤쪽에 좌우로 달린 뿔)이 달려 있다. 복두는 다른 말로 절상건(折上巾)⋅파두(帕頭)⋅연과(軟裹)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서 보듯 그 본바탕은 건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새로 급제한 사람이 쓰는 것이다. 사모와 비슷하다. 지금은 중국의 유건을 대신 쓴다.”고 하였다. 복두의 각은 원래 4개가 달려 있어 2개는 머리 뒤로 매고, 다른 둘은 턱 아래로 매어 벗겨지지 않게 하였다. 이때의 각은 연각(軟脚, 잘 휘는 뿔)이었으나 후대에 경각(硬脚)으로 되었다. 후대로 오면서 각은 2개로 바뀌었고, 오대(五代) 이후부터 평직(平直)으로 바뀐다. 송나라 때에는 군신이 모두 전각복두(展脚幞頭, 좌우의 각이 수평으로 된 복두)를 쓰게 되었다.
신라 진덕여왕 때부터 당나라의 복식제도와 함께 도입된 복두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덕여왕 때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복두를 쓰게 되었다.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의 벽화에 의하면 복두에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귀족과 관료는 물론 백성까지도 복두를 썼다고 한다. 다만 계급에 따라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고려에서는 개국 초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가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중국 오대의 평직으로 된 전각복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각의 길이가 어깨보다 넓었으나 고려말이 되면 짧아진다. 고려 초에는 문무백관과 사인들이 모두 복두를 썼으나 고려말에 이르면 양반집 종들도 쓸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복두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왕세자와 백관의 공복으로 정하였으나, 공복이 사라지면서 의례를 행할 때만 사용하게 되었다. 복두는 중국에서는 청나라로 접어들면서 사라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례복이나 급제관복으로 한말까지 사용되었다. 특히, 서리 계급의 관모로 널리 사용되었고, 악공의 관모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장원급제 시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는 풍속이 있었다.